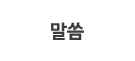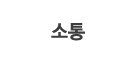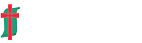송영춘목사님 로뎀나무칼럼(2017.11.12)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-11-12 13:46 댓글0건관련링크
본문
송영춘목사님 로뎀나무칼럼(2017.11.12)
어제는 우리교회 근처에 있는, 말 그대로 대형교회의 부목사가 찾아왔다. 미리 전화로 방문의 취지와 시간의 약속을 한 터였다.
“우리 교회가 일 년에 한 두 번씩 인근에 있는 작은 교회를 방문해서 새벽예배를 함께 드리는 행사를 하는데 금년에는 아멘교회를 방문하고 싶은데 목사님, 허락해 주시겠습니까. 한 30여명 올 것 같습니다.” 필요이상의 겸손한 태도에 그 의도가 엿보이는 것 같아 오히려 조금 언짢았다.
“그 행사를 갖는 취지가 뭡니까?” 나의 질문에 “이렇다 할 큰 취지는 없습니다.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인근에 있는 교회와 함께 하자는 취지입니다.” 순간 ‘함께한다’는 의도가 명쾌하지 않았다. “아니 이왕에 함께 한다는 취지라면 그 큰 교회에서 한 백 명 작은 교회에 보내주는 것이 맞지 단 하루, 그것도 새벽예배가 뭡니까?” 웃으며 한 말이지만 노기 섞인 진심이었다. 이 말에 죄 없는 그 부목사는 더 송구하다는 표정으로 “그래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얼굴도 익히고….” 어렵다! 나의 날 선 질문도 어렵고, 측은해 보이는 부목사의 궁핍한 대답도 어렵다.
안 된다고 하면 패배감과 박탈감에 그런다 오해할까봐 거절하기 어렵고, 좋다고 하자니 무의미한 이벤트에 동조하는 것 같아 어렵다.. 그래도 들고 온 ‘정관장’ 선물세트 다시 들려 보내면 실례가 될 까봐???(사실은 무엇이 들었나 궁금했다.) 날짜를 잡고, 혹 우리 교회가 그날 준비할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돌려 보냈다.
돌아가는 그 부목사님의 처진 뒷모습을 보는 것이 제일 어렵다. “에이! 도대체가!”
가로수 단풍이 보기 좋게 물들어 넋을 놓기 좋게 익어 가더니 어느덧 O,헨리의 ‘마지막 잎새’를 연상 시키는 나무들이 늘어간다. 며칠 전까지 그 많게 달려 있던 과실수의 열매들이 이제는 까치밥만 남겨놓고 있다. 정말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. 어제는 이런 살풍경들만이 나를 더 ‘춥다’ 느끼게 한 것은 아닌 것 같다. 그런데 춥다.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‘추위를 느낀다.’
마가렛 미첼의 소설보다 영화가 더 유명한 ‘바람과 함께 사라지다’의 명대사 “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뜬다”는 언제나 희망을 가졌던 서부개척시대의 미국인들의 긍정적이고 도전적 개척정신을 소롯이 담은 명언이다. 사실 이 말은 ‘내일의 태양’이라는 새로운 태양이 뜨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일 것이다. 나에게,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, 또 다른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. 이것이야 말로 공평한 공의로운 진리가 아니겠는가. ‘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뜬다’
마지막 잎새가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다. 까치들은 뭐하냐, 빨리 와 늬들 밥 먹지 않고…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